 박충기 메릴랜드주 행정법원장. 권민철 기자
박충기 메릴랜드주 행정법원장. 권민철 기자1970년대 초, 열두 살의 소년은 서울에서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로 이민갔다.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지만, 세상은 낯설고 차가웠다. 또래 아이들은 그를 '칭크(Chink,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적 호칭)'라 불렀고, 여자 동급생의 부모는 사냥총을 들이대며 "눈 찢어진 칭크는 집에 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방인'임을, 그리고 차별이란 것이 인간을 어떻게 짓밟는지를 처음으로 배웠다.
반세기가 흘렀다. 소년은 미국 메릴랜드주 행정법원장(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이 됐다. 60명의 미국인 판사를 거느리는 자리다. 이름은 박충기. 한국계 이민 1세대가 소수자의 굴욕을 딛고 미국 사법부의 한 축으로 올라선 드문 사례다.
그가 지난주 서울에 왔다.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을 위해서다. CBS는 한국에 만연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주제로 그를 인터뷰했다. 서울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전수조사 중이다. 포럼이 열리고 있는 더 플라자 호텔에서 만났다. 그의 한국말은 어눌했지만 전달하려는 뜻만큼은 명확했다.
그는 인터뷰를 시작하며 "차별은 악"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에서 다수였을 땐 몰랐습니다. 미국에 와서 소수자가 되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알게 됐습니다." "좋은 사람들의 도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차별이 만연하던 70년대 미국에는 악마들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들 덕분이었다. 학교 교사, 교회 목회자,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낯선 땅 외로움 속에서 손을 내밀었다.
그는 "차별만큼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바로 그 친절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라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그 고난을 극복하며 성장했다. 역경은 인간을 부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련시킨다는 교훈을 얻었다.
"인내심과 회복력이 길러졌습니다. 힘든 일을 기회로 보게 됐죠. 어려움이 제 성격을 강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제 성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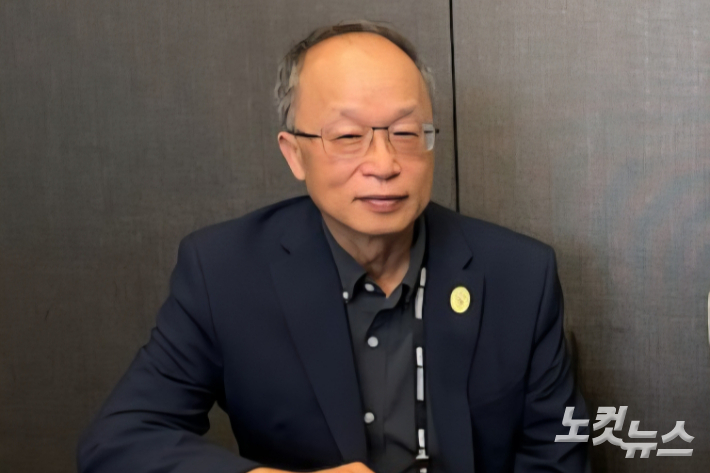 박충기 법원장. 권민철 기자
박충기 법원장. 권민철 기자"한국, 이미 다민족 사회… 그런데 폭력과 차별이 난무하다니"
최근 한국 사회 실상을 접한 그는 충격의 연속이었다.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를 향한 사회적 폭력과 차별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
"이제 한국도 다민족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폭행당하고, 임금을 떼이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다고 하니 너무 충격입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차별의 악몽을 가진 나라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여성 차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은 인구의 절반입니다. 인구 절반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요. 조선도 양반 상놈을 나눠 차별하는 바람에 국가의 큰 인적자산이 사장됐죠. 그래서 망한 것 아닌가요" 그의 진단은 냉정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꺼리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들 없이는 나라가 굴러가고 발전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소속감을 줘야합니다. 그래야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야 그들도 이 사회를 위해 희생하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희생으로 나라 돌아가…그들의 가치 인정해야"
그는 차별이라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한국 사회에 세 가지를 주문했다.
첫째는 편견의 전환이다. 한국 사회는 소수자·약자를 주변부로 밀어내는 구조를 공고히 해왔다. 그는 다양성을 포용해야 더 안정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람들은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나 경쟁자로 보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한국의 산업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미국이 한국전에 피 흘린 참전용사를 기리는 것처럼, 한국도 지금 희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법적 보호의 제도화다. 30년 넘게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판사의 경험 상 법적 기틀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회 변화의 강력한 동인이라는 게 그의 신념이다.
"미국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흑인·아시아인 차별이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이 통과된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문화를 끌어올린 겁니다. 한국도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차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줘야 문화가 바뀝니다."
셋째는 연대의 조직화(Coalition Building)다. 이 역시 그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는 다른 아시안 및 흑인 커뮤니티와 연대해 메릴랜드 코리아타운을 설치하고, 설날 기념일을 제정해 냈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나 혼자 성공"이 아닌 "공동체의 성장"을 이뤄낸 경험을 축적해 온 것이다.
"소수자 혼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가 히스패닉, 흑인과 손잡고 권리를 넓혀왔듯, 한국의 이주민들도 노동조합 등과 힘을 합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조도 이주민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외국인에게 차등 적용하자는 발상은 위험합니다. 그건 곧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까지 끌어내리는 겁니다. 외국인을 지켜주는 게 곧 한국인을 지켜주는 겁니다."
"한국인도 해외서 차별…인권국가여야 선진국"
기자의 질문이 끝난 뒤에도 그는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스스로를 선진국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경제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권이 존중받는 국가여야만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도 해외에 나가 차별을 받습니다. 그 아픔을 안다면, 한국 안의 이주민을 똑같이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게 한국이 더 강해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