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 김현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이번 화재도 과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처럼 또 항공기 기내 화재처럼 리튬 이온 배터리가 문제였습니다. 배터리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대체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게 뭐길래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길래 이렇게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또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어제는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허술한 정보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면 오늘은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죠, 이덕환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덕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덕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뷰에서도 저희가 다뤘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뭔지 많이들 알고는 계십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죠. 리튬 이온 배터리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 이덕환> 1990년대에 개발이 돼서 이제 한 20여 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입니다. 다른 건전지나 납축전지에서는 발화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작동 원리가 기존의 다른 배터리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발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기술이고. 그래서 사용상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위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 김현정> 우리가 흔히 쓰는 AAA 이런 건전지 있잖아요. 그런 건전지는 불이 날 가능성이 없어요? 교수님?
◆ 이덕환> 전혀 없습니다. 그 불 속에다가 던지면 불이 붙기는 하지만 스스로 불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전지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거라서 건전지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화학 반응이 멈춰버리고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지 않고 제일 가벼운 금속 원소인 리튬의 이온을 음극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외부 회로에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안에 그 이온이 잔뜩 한쪽에 몰려 있는 상태이고 그 이온이 반대쪽 정극으로 함부로 이동을 시작을 하면 소위 열폭주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전이 다른 거군요. 기존의 건전지와 리튬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이름만 배터리 한국말로 하면 그게 건전지니까 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완전히 기전이 다른 완전히 작동하는 프로세스가 다른 게 일반 건전지와 리튬이온 건전지다, 다르다. 이 말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는 스마트폰 배터리, 태블릿PC 배터리 그거 외에도 또 어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 이덕환>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한번 세봤더니 집하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게 한 7~8개가 되더라고요.
◇ 김현정> 뭐 뭐 있었어요? 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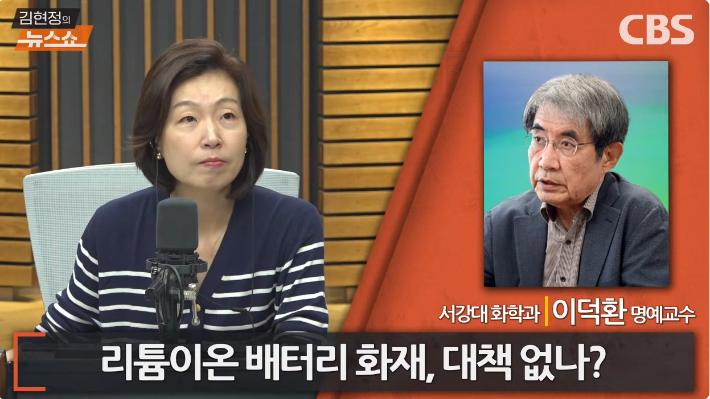
◆ 이덕환> 휴대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오디오 배터리도 있고 건강에 안 좋은 전자담배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휴대용 선풍기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 이동식 청소기들 그다음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공구들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화재가 난 그 데이터센터의 UPS라고 무정전 시스템입니다. 이 무정전 시스템은 데이터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민감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또는 대형 건물의 지하실에도 무정전 장치 UPS가 설치되어 있고요. 요즘 보급이 빨라지고 있는 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설비에도 이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이름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전기 끊겨도 이 녀석들이 대체제로 이용이 돼야 되니까 병원에서도 당연히 이거 쓰고 있고 많이들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리튬이온 배터리다. 그러면 흔히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충전해서 몇 번이고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다 리튬이온 배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이덕환> 그렇습니다. 전깃줄이 없는 전기 전자제품은 전부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그 무게가 가볍고 가격은 좀 비쌉니다. 그런데 무게가 가볍고 전지의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 김현정> 제가 그 질문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몇 번이고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배터리는 꼭 리튬을 사용해야만 되는 건가, 왜 리튬인가. 그 질문드리려고 했거든요.
◆ 이덕환> 과거에 우리가 휴대폰을 처음 개발했을 적에는 니켈, 카드미늄 등을 사용하는 2차 전지, 충전 가능한 전지를 썼었는데 그때는 조금 사용하다가 보면 충전량이 자꾸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그게 메모리 효과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특성인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런 특성이 전혀 없습니다. 충전해서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계속 충전하고 방전을 해도 전지의 특성이 전혀 나빠지지 않는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런 거군요. 말하자면 리튬을 썼을 때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은 꽉 잡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가 꽤 많았어요. 이때마다 차주가 과충전을 해서 그렇다. 이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 이덕환>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과충전 방지 회로가, BMS라고 하는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충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급속 충전을 했건 완속 충전을 했건 과충전 자체가 불가능한 게 요즘에 전기자동차고요.
◇ 김현정> 교수님, 그때 사고 났을 때, 지하 주차장에서 불나고 막 이랬을 때마다 차주가 이거를 계속 꽂아놔서 100만큼 충전이 돼야 되는데 110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80만 해라, 90만 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 이덕환> 전기자동차에는 최고 충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자기네들이 알아서?
◆ 이덕환>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화재가 발생한 대전의 정보원에서는 UPS는 상시적으로 완충 상태를 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 김현정> 예.
◆ 이덕환>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의미에서는 과충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충전이면 반드시 불이 나는 게 아니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는 대부분이 그 내부에 아까 그 마이너스 극 쪽에 리튬이온이 모여 있다고 했는데 그 모여 있는 리튬이온이 플러스 극 쪽으로 함부로 건너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분리막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플라스틱 막인데 이 플라스틱 막이 그 어떤 이유로든지 찢어지거나 훼손이 되면 구멍이 생겨서 그쪽으로 리튬이온이 한꺼번에 그 대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직접적인 원인은 분리막 파손이다.
 (대전=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화수조에 담겨 있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된 바 있다. 2025.9.28 nowwego@yna.co.kr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화수조에 담겨 있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된 바 있다. 2025.9.28 nowwego@yna.co.kr 연합뉴스◇ 김현정> 그렇군요. 이번 대전에 국가정보관리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의 원인은 그 내부 분리막, 음극과 양극을 갈라놓는 그 분리막의 훼손 때문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이거는 전기자동차 화재에도 유효합니까? 거기도 그렇습니까?
◆ 이덕환> 그렇죠, 마찬가지죠.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운행 중에 그 충격을 받아서 훼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이 시작되고 나서 화재로 금방 이어지는 게 아니고 상당한 분리막이 훼손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저녁에 주차장에 세워놓을 적에는 멀쩡했었는데 새벽에 불이 나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괜히 소비자들이 과충전해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과충전 문제가 아닌 결국 분리막 훼손, 분리막 문제라는 말씀. 그럼 이번 같은 경우, 이번 대전 국가정보관리원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이유로 분리막이 훼손될 걸 거라고 보세요? 노후에서 그렇다?
◆ 이덕환> 분리막 훼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충격이나 변형을 시켜서 안에 있는 얇은 막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전기자동차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그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UPS나 ESS에 들어 있는 리튬이 배터리는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번 대전 화재의 경우에는 그 배터리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 용량이 상당히 큰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들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부딪혔거나 이렇게 해서 외부에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밀 감식을 해봐야지 아는 거고요. 다른 가능성은 배터리 내부의 문제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를 잘못 만들거나 또는 그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리막이 오랜 시간에 따라서 훼손이 되는, 저절로 훼손이 될 수도 있고 그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에 전해질이라는 액체 용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액에서 바늘 모양의 그 침전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뾰족한 침전물이 만들어져서 그게 분리막을 찌르는 거죠. 그러면 그 분리막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찢어진 정도가 너무 커지고 그 리튬 이온이 그 틈새를 통해서 대량으로 이동을 시작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경우였을지, 그 가능성 중에서 조사를 해봐야겠고.
◆ 이덕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면 좀 일상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뭘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 1월부터 7월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거의 200여 건이더라고요. 이 정도라면 우리가 뭘 좀 주의해야 될까, 팁을 주시겠습니까?
◆ 이덕환>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0여 건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를 생각해 보면 그 리튬이온 배터리는 상당히 안전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자칫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격을 가하는 거를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떨어뜨리거나 비틀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소화라는 화재 진압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에서 폭발적으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충격에 의해서 옆에 있는 다른 배터리들이 다시 또 그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해서 연이어서 폭발해서 이번 경우에도 무려 22시간이나 화재가 지속이 됐거든요.
◇ 김현정> 10초 남았습니다.
◆ 이덕환>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재가 발생하면 물통에다가 던져 넣는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