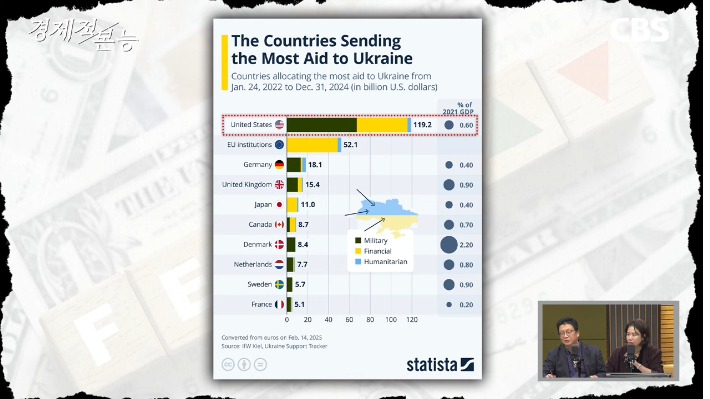다시 못 볼 희대의 장면, 트럼프-젤렌스키 설전
지난 2월 28일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 격렬한 언쟁으로 마무리된 정상회담에 대해 제성훈 교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 개발 협정 서명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정상회담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전으로 치달을 줄은 몰랐다"고 언급했다. 각각 군복과 정장으로 상징하고 싶었던 두 정상의 상황 인식은 무엇이었고 얼마나 달랐을까.
광물 개발 협정 서명에 대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것으로 인식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군사적 지원과 안전 보장"이라고 이해했다. 인식 차이를 확인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발언이 겹치는 가운데 트럼프는 "당신은 전쟁에서 지고 있다. 카드가 없다. 수백만 명의 목숨과 제3차 세계대전 위험을 가지고 도박하면 안 된다"며 협상을 강요했다.

미국이 동맹국 우크라이나를 패전국으로 만들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결렬 직후 초강수를 두었다. 무기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미국과 영국의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도 금지시켰다. 제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의 위성 정보와 정찰 첩보 없이는 우크라이나군이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며 젤렌스키가 실질적으로 백기 투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설전이 벌어진 지 불과 이틀 만에 젤렌스키는 "광물 협정 체결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제 교수는 이같은 트럼프의 결정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패권 전략 변화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더 이상 단극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세계는 다극 체제, 혹은 강대국 협조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극 미국 패권이 곧 미국의 국익으로 인식되던 시대가 지났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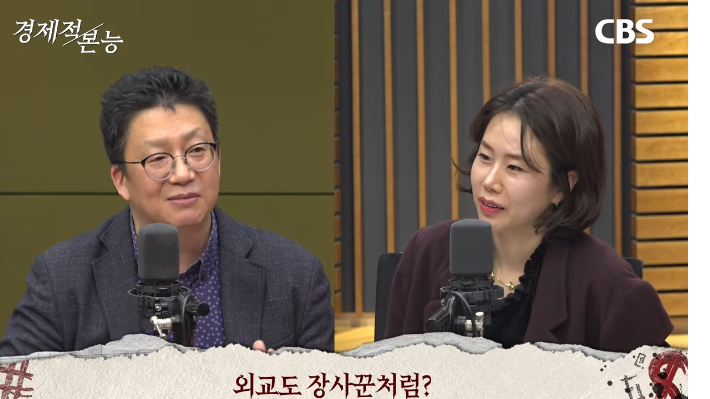
트럼프의 전략? 러시아의 지역 패권 인정, 중러 이격
미국의 목표는 단순한 전쟁 종결이 아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격시키려 한다는 역키신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게 제 교수의 분석이다. "냉전 시절 키신저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개선해 소련을 견제했듯, 이번에는 미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미러(美露) 협상이 급진전될 것이라는 전망과 일치한다. 실제로 지난 2월 12일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했고,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미러 첫 공식 협상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제 교수는 "이번 협상의 주요 주제는 종전뿐 아니라 미러 관계 정상화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